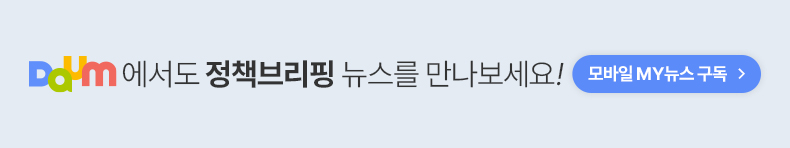[강원 화천]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산골짝에 다람쥐 아기 다람쥐. 도토리 점심가지고 소풍을 간다.”
‘산토끼’와 ‘다람쥐’가 들어간 동요 가사다. 과거 우리 주변 야산에 지천이던 다람쥐와 산토끼가 전설 속의 동물로 남겨지게 될 지도 모르겠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걸까?
![아기 산토끼. 멸종위기종이 될지도 모를 심각한 상황이다. [출처]-뜨네농원 대표께서 사용승인을 하신 사진입니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5.03/08/SDC10879405.jpg) |
| 아기 산토끼. 멸종위기종이 될지도 모를 심각한 상황이다. (출처=뜨네농원) |
“들고양이 때문이다, 등산객이 많아졌다, 청설모가 다람쥐를 잡아먹더라, 옹달샘이 없어졌다, 각종 개발로 산이 줄었다, 인간들의 무분별한 포획 때문이다, 농약이 원인이다.”
지난 2월, 페이스북에 ‘산토끼가 없어졌다.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타임라인엔 다양한 댓글이 올라왔다. ‘들고양이 때문이다‘란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렇다면 ‘들고양이가 자신의 크기 만한 산토끼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야생동물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그런 일이 있어요?”라는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학술적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작 현장엔 약하다’는 생각을 가져왔지만, 다소 뜻밖의 대답이었다.
이럴 때 최고의 전문가는 산과 밀접한 곳에 사는 농민들일 수 있다.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에서 평생 꽃 농사를 지어온 지인학(54세) 씨는 “들고양이 문제는 이미 심각성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
| 진인학 씨를 그의 백합농장에서 만났다. |
“산토끼와 같은 작은 야생 초식동물 감소는 맹금류가 사라진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 씨는 과거 산골마을에서 흔히 목격되던 부엉이나 매도 없어진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옛날 매가 하늘을 빙빙 돌면 암탉들은 병아리 숨기기에 바빴다. 닭들도 안전할 수는 없었다. 작은 강아지도 공격 대상이었다. 마을사람들은 가축을 지키기 위해 그물을 이용한 매나 부엉이 사냥을 하기도 했다.
그때문일까. 매나 부엉이가 가축을 공격하는 일은 흔치 않았다. 이유는 산과 들에 들쥐나 산토끼, 산새, 다람쥐 등 소형 초식동물들이 많았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이젠 하늘을 맴돌던 매의 모습과 추운 겨울밤 애처롭게 들리던 부엉이 소리도 사라진 지 오래다.
“옛날, 야생 동식물보호 관련법이 생기기 전, 산토끼를 잡으러 산에 가면 하루에 7마리 정도는 쉽게 잡았지요. 그래도 산토끼 개체 수가 줄어드는 일은 없었지만, 요즘 산에 들어가면 산토끼 흔적도 찾을 수 없어요. 대신 눈에 찍힌 야생 고양이 발자국은 숱하게 목격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들고양이들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에 지인학 씨는 “예전에 농촌이나 읍내의 가정에서 기르던 애완용 고양이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집을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와 달리 농촌 들녘에는 들쥐, 다람쥐, 산토끼 등의 설치류와 작은 산새, 메뚜기, 개구리 등 작은 동물들이 많기에 야생 본능이 남아있는 고양이들이 들이나 산에 나가 살게됐다.”라며 “한번 집을 나간 고양이들은 사람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되고, 산에서 1년에 4회 정도, 많게는 한 배에 6마리 이상 새끼를 낳으니 야산은 온통 산고양이 천지라는 표현이 맞다.”는 말도 덧붙였다.
 |
| 산토끼 발자국. 해발 800미터가 넘는 산골짜기에서 겨우 찾았다. |
“산토끼뿐 아니라 사실 꿩, 멧새, 북방산 개구리 개체수도 현저히 줄었다고 봐야합니다.”
꿩과 멧새는 나무에 집을 짓는 멧비둘기, 산까치, 때까치, 뱁새 등과는 달리 풀포기 또는 땅에 집을 짓는 새이다. 이들 또한 야생고양이들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개구리는 왜?”라는 질문에 그는 “요즘 논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과거처럼 많지 않다. 개구리가 알을 낳을 터전이 없어졌다.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파종 시 농약을 사용하지 않던 옛날 방식과는 달리 제초제를 뿌리니까 올챙이들이 전멸하게 되고, 연쇄적으로 개구리가 없어질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
| 지난해 봄에 만났던 산고양이. 나를 보자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다. |
지난 3월 3일, 인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동 강당에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 기념 행사가 열렸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을 ‘야생동식물 범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Wildlife crime is serious, let's get serious about wildlife crime)’로 정하고 야생동물 밀렵에 사용된 도구 전시를 비롯해 멸종위기 종 복원과 밀렵을 주제로 한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야생동식물의 다양성이 회복될 때 지구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며 야생동물 포획 금지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포획에 의한 위기가 아니라 야생 고양이 증가에서 알 수 있듯이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파생된 심각성이다.
 |
| 겨울철이면 산토끼 발자국으로 얼룩졌던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
1970년대만 해도 서울 남산에는 산토끼와 다람쥐들이 살았다고 한다. 이들의 멸종 원인에 대해 환경오염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던 고양이 방치가 주원인이라는 주장도 강하다. 초식 야생동물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비단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정책을 다정다감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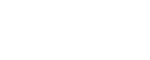
![아기 산토끼. 멸종위기종이 될지도 모를 심각한 상황이다. [출처]-뜨네농원 대표께서 사용승인을 하신 사진입니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5.03/08/SDC1087940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