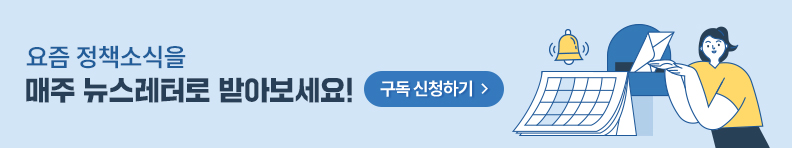콘텐츠 영역
내 이름에 올라타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조선시대 불세출의 화가를 꼽을 때는 단원 김홍도를 첫 손가락에 올려야 한다. 그림도 그림이지만, 그의 이름과 자를 풀이해 봐도 그 의미가 여느 화가와 달리 매우 웅숭깊다. 우선 ‘홍도(弘道)’라는 이름은 ‘도를 넓힌다’는 뜻이다. 공자 말씀에 ‘도가 사람을 넓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도를 넓히게 돼있다’고 했다. 도가 있다한들 사람이 그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도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김홍도의 자는 ‘사능(士能)’이다. ‘선비가 능히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또 맹자 말씀에서 따왔다. 맹자가 이르길 ‘일정한 재산이 없어도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선비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했다. 그러니 김홍도의 본명과 별명은 공맹(孔孟)에서 나온 셈이다. ‘단원(檀園)’이라는 호는 명나라 화가 이유방의 호에서 빌려왔는데, 이유방 역시 문인적 심회가 깨끗한 작품을 남긴 사람이다. 김홍도는 이름에서부터 자기 삶의 지향성을 애저녁에 밝힌 인물이었다.
.jpg) |
| 김홍도, ‘포의풍류’, 18세기, 종이에 수묵 담채, 27.9×37㎝,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
단원의 작품 하나를 고른다. 제목은 ‘포의풍류(布衣風流)’, 문자 그대로 ‘베옷 입은 자의 풍류’란 뜻이다. 왼쪽에 적힌 글귀를 풀이하면 그림의 주제가 눈에 쏙 들어온다. ‘종이로 창을 내고 흙으로 벽을 발라 한평생 베옷 입고 살아도 그 속에서 노래하고 읊조리리.’ 베옷을 입는다는 게 뭔가. 벼슬하지 않고 산다는 얘기다. 그런 이를 일러 일쑤 ‘포의처사(處士)’라 했다. 그림의 주인공은 일찌감치 벼슬길에 나서지 않은 선비이거나, 단단한 마음먹이 끝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대부로 봐도 상관없다. 그는 가난하게 산다. 가난하게 살아도 시 짓고 음악 즐기는 가운데 절로 낙(樂)이 깃든다는, 이른바 안빈낙도(安貧樂道)의 풍경을 그려놓은 그림이 ‘포의풍류’다. 버선을 벗어던진 저 맨발바닥, 이것이 그의 자유혼을 대변한다. 자, ‘안빈’이라 했다. 가난한 가운데 편안함을 찾는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 가진 게 없는데 편안할까. 가난은 불편하다. 하여, 안빈은 오르기 어려운 경지다. 불편을 이겨내는 마음가짐이 없고선 이룰 수 없다. 비교가 우스울지 모르지만, 재물을 챙기는 것 못잖게 청빈을 지키기가 어렵다. 벼슬자리에 있는 몸이라면 더 그렇다.
조선 전기 때 문신 정붕의 일화가 있다. 그는 교리(校理) 벼슬을 지내며 뇌물이라곤 한 톨도 받지 않았다. 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유자광은 그의 인척이었다. 정붕은 심부름하는 종이 유자광의 집에 갈 때 줄로 팔을 꽉 조이게 묶어서 보냈다. 묶인 곳이 아파 그 집에 오래 있고 싶어도 못 있게 했다. 유자광이 행여 먹을거리를 보낼까 미리 걱정해서다. 양식이 떨어진 정붕의 아내가 유자광에게 손을 내밀었다. 받은 쌀로 밥을 지어 내놓자 정붕이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는 곧바로 밥상을 물리며 말했다. “아침에 비지를 주기에 쌀이 없는 줄 알았소. 이는 내 잘못이지 당신 허물이 아니오.” 그는 친구에게 쌀을 꾸었다. 그리고 딱 유자광에게 받은 만큼 돌려보냈다. 정붕은 궁핍에 대해 너절한 변명거리를 늘어놓지 않는다. 가난을 자청했기에 자기를 지키는 법을 안다. 그의 정의는 떳떳하다. 그의 안빈은 어떤가. 곧 눈물겨운 투쟁의 소산이다. 안빈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엄혹한 자기절제로 얻어낸 도(道)이기 때문이다. ‘선비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가난이라 해도, 아무 선비나 심부름 길에 나선 종의 팔을 묶지는 않는다.
정붕의 아내 처지가 얼마나 딱했을지, 나는 짐작한다. 하지만, 정붕은 단호하다. 권력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지 가족이 누릴 덤이 아니다. 처신 바른 옛 어른들은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가족의 들뜸을 경계했다. 옛 문헌을 읽다보면 오늘을 사는 속인의 짓거리가 부끄러워진다. 배운 자는 많되, 청렴과 결백의 미덕이 오간 데 없다. 우리는 가족 이기주의 앞에서 허물어지고 조직 보신주의 뒤에서 뻔뻔해진다. 관료가 인사에서 제 식구를 챙기고, 재벌이 부당한 거래를 일삼으며, 정치인이 삿된 구전을 위해 공정을 외면한다. 그러고도 뉘우침이 없다. 수백 년을 내려온 조선의 강상(綱常)이 한낱 구두선에 불과했던 것일까. 허욕은 망동을 낳고 허세는 망신을 기른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나는 무엇보다 자기의 이름을 시쁘게 여긴 탓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평생 자기 이름을 걸고 행세한다. 모름지기 이름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현인들이 강조한 ‘정명(正名)’이다. 명분에 걸맞은 실질을 도모한다는 뜻이다. 내 이름이 떳떳해지려면 내 이름 위에 올라탄 허위와 과시를 눈여겨봐야 한다. 어찌 김홍도만 도를 넓혀나가야 할 사람이겠는가.
◆ 손철주(미술평론가)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