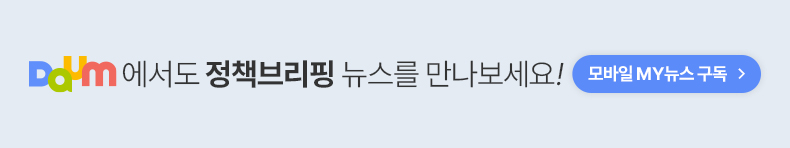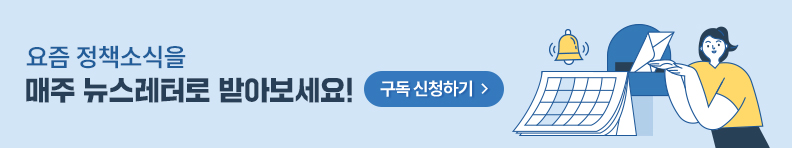콘텐츠 영역
도서관에서 만나는 계절과 계절 사이

가을이 왔다 말을 하기 새삼 무안하게 어느덧 겨울이 되어버렸다.
가을 그리고 봄, 여름, 겨울과 같은 계절이 왔다고 말하기는 쉬우나 가을이 과연 무엇인지는 말하기가 어렵다.
가을의 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가능할까?
입추(立秋)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지만, 정작 입추에는 가을의 자취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나무 끝에 매달린 단풍 하나에 가을을 느낄 수도 있으며, 사랑 끝에 매달린 회한에 가을을 마주하고 있다면 가을은 인생 전체가 될 수도 있다.
무언가를 완벽하게 분류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 세상에 완전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없기 때문이다.
.jpg)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존재 사이마다 있는, 무엇인지 모를 경계를 명확하게 할 때만이 그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역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사서의 주된 업무 중 하나는 청구기호를 붙이는 일이다.
사서는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이용자가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책에 청구기호를 매긴다.
AI가 많은 부분을 대체하게 되겠으나,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수많은 애매모호함은 결국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할 때가 많다.
.jpg)
하나의 책이 하나의 청구기호로 설명될 수 있을까? 가끔은 곤혹스럽다.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일관성으로 한 사람의 삶을 설명할 수 없듯이, 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책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청구기호를 붙인다.
책에 그러하듯이, 삶에 대해서도. 하지만 청구기호가 전부가 아니라면 잡념을 잊지 않는다.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가을에 대해서도 또 삶에 대해서도.
서가에 나란히 꽂힌 책, 그 속에 펼쳐진 사연들이 새어 나오면서 도서관은 웅성거린다.
몽땅 색연필로 집을 짓고 칸마다 들어앉은 방에 부는 바람이 참 좋다.
무디어진 서가 모퉁이 기울어진 숫자들이 눈언저리에서 책장이 넘어가고 자리를 옮겨가는 시곗바늘 코끝에 너울대는 국화꽃 향기가 불어온다.
.jpg)
누군가 글을 쓰고,
누군가 청구기호를 붙인다
000 총류
100 철학
200 종교
.
.
.
800 문학
900 역사
000과 100 사이, 100과 200 사이 … 800과 900 사이
공허를 지나 기울어진 숫자들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빛줄기
고요를 비우고 침묵을 채운다
책갈피, 그 접힌 군살
떠나지도 가버리지도 못했다고 애꿎게 뜯고 붙이기를
반복한다,
모은다 수집한다 정리한다 껍데기들
더러는 총류로 더러는 철학으로 더러는 종교로 더러는 역사로
그리고 이따금 문학 그 중에서도 시는 811에서 0.6을 덧댄 자리
얽히다 빠뜨리다 저버리다 새살들이 틈 벌-리-어-
반복한다
책(冊)은 늘어진 커튼
이른 아침을 열고 더딘 밤을 닫는다
거꾸로 선 채 멈춘 그 자리
멈춘 그 자리
그 자리에
- 한숙희 詩 ‘사서일지’

◆ 한숙희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홍보팀 근무, 2021년 공직문학상 시 부문 은상 수상, 같은 해 <시인정신>으로 등단했다.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출근하는 35 년 차 사서이자 도서관에서의 일상을 시로 구현해내는 시인이기도 하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