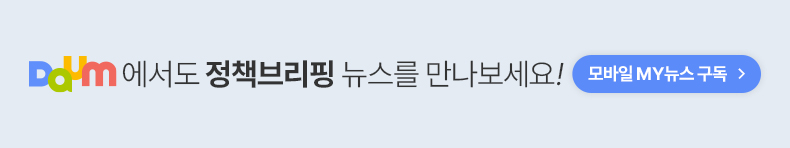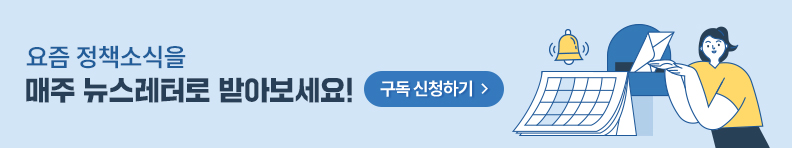콘텐츠 영역
처음이 모여 한 권의 책이 된다.

책이 지나간 자리에는 사서가 있고 시간이 머무르는 곳에 도서관이 있었다.
사서로서 공직 생활을 한 지도 어느덧 35년이 되어간다. 임용 첫날, 출근길 기억은 35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다. 1990년 6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장마철이 하필이면 도서관 입사 후 첫 출근길이었다. 길바닥은 물론, 버스 안까지 물이 차올라서 오전 내내 버스에 갇혀 있었다. 핸드폰도 없던 그 시절, 첫날부터 지각이라니. 마음만 동동거리며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다행히 차츰 물이 빠지면서 무려 5시간이 지나서야 내가 타고 있던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힘겹게 도서관에 도착했다. 지옥에서의 탈출, 그래도 나에게 비치는 햇살이 참 좋았다. 첫 출근이었으니까. 처음의 설렘은 장마의 폭우도 걷어낼 수 없었다.
모두에게 처음은 설렘이고 도전이다.
1990년 문화부 신설과 더불어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민이 도서관에 대해 궁금한 내용에 대한 안내와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문헌 전반 상담을 제공하는 도서관 참고서비스 ‘글방전화’ 사업을 운영하였다. 사서가 되고 처음 맡은 업무가 바로 이 글방전화였다.
.jpg)
“따르릉” 전화벨 소리와 함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는 척척박사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했다. 모르는 내용은 브리태니커 사전을 찾아서 답을 해주거나 주요 일간지를 신문 스크랩 해가며 사전 지식을 쌓아갔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바쁘게 움직이며 하루를 보냈다.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기에 민원인들이 원하는 만큼 답변을 해드리기 쉽지 않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난다.
가끔은 ‘사서가 이런 업무까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이 역시 내가 맡은, 또 해내야 할 업무였다. 도서관을 사랑하고 궁금해하는 모든 분에게는 적합한 서비스와 세심한 안내가 필요했고 그 역시 사서로서 해내야 할 일이라 생각하니 답변 하나하나에 성의가 생겼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사서로서 써 내려간 일상들은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늘려 갔다.
시간이 지나 이제는 해마다 신입 사서들이 내 앞에 서 있다. 여러분은 어떤지 궁금하다. 처음이라는 설렘과 마주했을 때를 떠올려보자.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뛰던 시절, 처음과 마주했던 시절 말이다.
낯선 시작을 뒤로 하고 이제는 신나는 일, 기분 좋은 만남이 차곡차곡 쌓여간다. 그렇게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그 무게에 짓눌린 날들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더는 넘기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세월이 켜켜이 쌓여가면 우리의 삶은 한 권의 책처럼 견고하고 단단하게 엮여있다. 때론 행복하고, 가끔은 불행하기도 한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책 말이다.
.jpg)
직업적으로도 책과 가까이하는 삶을 살면서 또 다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시를 끄적인 세월도 비슷하게 되어간다. ‘맡는다’를 의미하는 사(司)와 ‘책’을 의미하는 서(書). 사서라는 익숙하다 못해 익숙한 단어지만, 가끔은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다. 책을 쓰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책을 읽는 것도 아닌, 책을 맡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고민한 시간도 비슷하게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고민 앞에서, 시를 되뇌었다. 시적 언어는 흔히 함축(含蓄)이라는 말로 설명되곤 한다. 일상적 언어에 기대어 있지만, 읽는 이로 하여금 일상적 언어를 넘어선 새로운 의미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시의 언어다.
그러니까 언어를 잠시 맡아두는 것이지요. 기쁨의 순간이나 슬픔의 순간에, 환희의 순간이나 좌절의 순간에 무뎌진 삶을 일깨우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시인은 읽는 이가 꺼내 보기 쉬운 자리에 언어를 배치한다.
이렇게 보면, 사서와 시인이라는 각기 다른 직업은 너무나 닮았다. 그리고 이용자를 위하여 책을 돌보는 일은 맡은 사서의 설렘은 읽는 이를 위하여 언어를 맡아둔 시인의 떨림과도 닮았다. 사서로서, 혹은 시인으로서 무언가를 맡는다는 일의 기쁨을, 그리하여 누군가의 마음에 가 닿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을 소개하고 싶다.

좁은 창문을 닫았다.
도서관은 넓은 창문을 내지 않는다.
밖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다.
서가도 언제나 좁다. 두 사람이 만날 수 없다.
도서관은 적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 홀로 적막히 들어갔다.
앞에 놓인 책들을 봤다.
세워진 책들 사이에 가로 누운 책이 있었다.
그 책 하나가 단 전체를 빡빡하게 만들었다.
그 책을 꺼내서 다른 책들과 나란히 세웠다.
어느 책은 거꾸로 서 있다.
익숙한 제목이 낯설게 다가온다.
그 책만 꺼내서 다른 책들과 나란히 세웠다.
어느 책은 엉뚱한 곳에 들어가 있다.
어울리지 않았다.
그 책도 꺼내서 다른 책들과 나란히 세우고 싶었다.
그 책을 제자리에 넣으려고 했다.
끝까지 들어가지 않아 줄이 맞지 않았다.
그 책 혼자 툭 튀어나왔었다.
손으로 다독이기도 했고, 쳐보기도 했다.
내 마음으로 되지 않았다.
그 틈새를 들여다보았다.
줄 세운 책들 뒤로 저 책이 있었다.
누가 감춰놓기라도 한 듯이, 저 책은 숨어있었다.
저 책을 꺼내 보았다.
저 너덜너덜한 수험서의 누러언내가 나의 손에도 스몄다.
책장을 넘겨보니, 마치 자기 책이라도 된 것 마냥 흔적들을 남겨놓았다.
줄도 맞지 않은 형광펜의 자욱들
한 켠에는 ‘부동산의 소유…’
나란히 세워지지 않은 저 책이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저 책을 그냥 두기로 했다.
좁은 창문을 연다.
- 한숙희 詩, ‘서가’

◆ 한숙희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홍보팀 근무, 2021년 공직문학상 시 부문 은상 수상, 같은 해 <시인정신>으로 등단했다.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출근하는 35 년 차 사서이자 도서관에서의 일상을 시로 구현해내는 시인이기도 하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