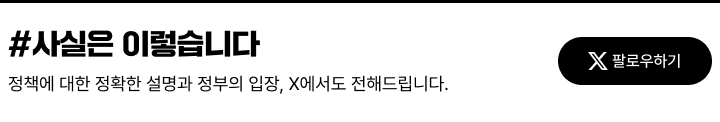법제처는 “결격조항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의 정비방안을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며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는 등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전략)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와 인사혁신처는 이 중 ‘피성년후견인’은 그대로 두고 ‘피한정후견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결격조항만 삭제하기로 했다. 한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은 전체의 10%에 불과하고 80%는 성년후견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법이 개정되더라도 후견을 받는 장애인의 10%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후략)
[법제처 설명]
ㅇ 법제처와 법무부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후견인 제도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노인 등을 자격 취득, 공직 임용, 임직원 채용 등 광범위한 직무에서 원천 배제시켜 위헌 소지가 크고,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피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직무에서 배제시킬 수 없어 결격조항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의 정비방안을 2019. 7. 9.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고, 각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시험제도, 신체검사 등을 활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도입해 개별 사안마다 장애인·노인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해 채용 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다만, 제도의 급격한 전환 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우선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부터 정비를 추진하고 그 시행 경과를 보면서 피성년후견인 결격조항까지 정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이번 정비의 범위가 반드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77)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